퍼시픽 리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퍼시픽 리그(太平洋リーグ)는 일본 프로 야구의 리그 중 하나로, 1949년 일본 야구 연맹의 분열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7개 구단(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오릭스 버펄로스, 지바 롯데 마린스,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스,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으로 시작했으며, 센트럴 리그와 함께 일본 프로 야구를 양분한다. 1975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했고, 1980년 리그 명칭을 퍼시픽 야구 연맹으로 변경했다. 2000년대 들어 지역 밀착 마케팅과 IT 기술을 활용하며 팬층을 넓혔다. 2010년대 이후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강세를 보이며, 2020년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3년 WBC 우승으로 야구 인기가 다시 높아졌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퍼시픽 리그 - 센트럴·퍼시픽 교류전
센트럴·퍼시픽 교류전은 일본 프로 야구의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 소속 구단들이 정규 시즌에 맞붙는 경기로, 리그 간 전력 평준화와 팬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 수는 축소되었고, 퍼시픽 리그가 통산 성적에서 우세하다. - 1949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 센트럴 리그
센트럴 리그는 1949년 일본 프로야구 재편으로 출범하여 팀 합병과 해체를 거쳐 현재 6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클라이맥스 시리즈를 통해 일본 시리즈 진출팀을 결정하는 일본 프로야구의 핵심 리그이다. - 1949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 DDR 오버리가
DDR 오버리가는 1948년 동독에서 출범하여 199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프로 축구 리그로, 베를리너 FC 디나모가 10번의 우승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했다. - 일본 야구 기구 - 센트럴 리그
센트럴 리그는 1949년 일본 프로야구 재편으로 출범하여 팀 합병과 해체를 거쳐 현재 6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클라이맥스 시리즈를 통해 일본 시리즈 진출팀을 결정하는 일본 프로야구의 핵심 리그이다. - 일본 야구 기구 - 클라이맥스 시리즈
클라이맥스 시리즈는 일본 프로 야구에서 일본 시리즈 진출 팀을 결정하는 포스트시즌 토너먼트로서, 각 리그 상위 3팀이 참가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리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리그에서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되었다.
2. 연혁
1949년 11월 26일 각 구단 대표자 회의에서 신구단 가입 여부를 두고 일본야구연맹이 분열되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 가입 찬성파인 한큐 브레이브스(후의 오릭스 버펄로스), 난카이 호크스(후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도큐 플라이어스(후의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다이에이 스타즈(후의 다이에이 유니온스)에 신구단인 마이니치 오리온스(후의 지바 롯데 마린스), 니시테쓰 클리퍼스(후의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스), 긴테쓰 펄스(후의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도 합류하여 총 7개 구단으로 '''태평양 야구 연맹'''(太平洋野球連盟)이 발족하고 결단식이 거행되었다. 1949년 시즌 막판, 폐막까지 3일을 남겨둔 시점이었다.[5] 나가타 마사이치가 태평양 리그의 초대 회장이었다.[1]
1950년에는 모기업의 지원으로 전력을 강화한 마이니치 오리온스가 우승을 차지했고, 일본 시리즈에서도 쇼치쿠 로빈스를 꺾고 일본 제패를 달성했다. 초기에는 오사카 타이거스(후의 한신 타이거스)도 참가를 예정했으나, 간판 카드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이탈하여 일본야구연맹에 잔류했다.[6] 이것이 현재의 센트럴 리그이다.
1950년대는 쓰루오카 가즈토 감독이 이끄는 난카이 호크스와 미하라 오사무 감독이 이끄는 니시테쓰 라이온스의 황금기였으며, 두 팀의 대결은 "황금 카드"라고 불릴 정도였다. 1959년에는 센트럴 리그와의 관객 동원 수가 엇비슷했던 적도 있었다. 한편, 홀수 구단으로 인한 경기 일정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1954년 시즌 개막 전에 다카하시 유니온스가 가입하여 8개 구단이 되었다. 같은 구단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3시즌만 참가하고, 1957년 2월에 다이에이 스타즈와 합병(다이에이 유니온스)하여 7개 구단이 되었다. 1957년 시즌 종료 후에는 다이에이 유니온스와 마이니치 오리온스가 합병(마이니치 다이에이 오리온스)하여 6개 구단이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6개 구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은 방송국을 계열사로 거느린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센트럴 리그의 인기를 높였지만, 대중 매체를 모체로 갖고 있지 않은 퍼시픽 리그에는 역풍이 되었다. 1960년 11월, 마이니치 신문이 다이마이 오리온스의 경영에서 사실상 철수하였고, 1965년에는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이마이 오리온스의 구단주가 된 나가타 마사카즈는 사재를 털어 도쿄 미나미센주에 1962년 도쿄 스타디움을 완성시켰다. 1969년 롯데 오리온스로 개칭하고, 그 다음 해인 1970년 도쿄 스타디움에서 리그 우승을 결정지었다. 그럼에도 퍼시픽 리그의 활성화에는 갈 길이 멀었고, 특히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V9(1965년~1973년 9년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을 시작한 이후로는 존재감이 희미해졌다.[7]
1969년 시즌 종료 후 발생한 검은 안개 사건은 니시테쓰 라이온스에 큰 타격을 주었고, 퍼시픽 리그 전체 이미지도 추락했다.[1] 영화 산업이 쇠퇴하면서 구단을 지원하던 기업들의 경영 능력이 약화되었고, 다이에이(나가타 마사이치 → 나카무라 나가요시) → 롯데, 도에이 → 닛타쿠홈 → 닛폰햄으로 구단 매각이 잇따랐다. (1973년 일본 프로 야구 재편 문제 참조)
1975년 퍼시픽 리그 관중 동원 수는 센트럴 리그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시즌제(1973년 ~ 1982년), 지명타자 제도(1975년 ~ 현재)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1970년대는 니시모토 유키오→우에다 도시하루 감독 아래 후쿠모토 유타카, 야마다 히사시, 나가이케 노부토 등을 보유한 한큐 브레이브스의 황금 시대였다. 1967년 리그 첫 우승을 시작으로 1978년까지 9차례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1975년부터 3년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1980년 리그 명칭은 '''퍼시픽 야구 연맹'''(パシフィック野球連盟일본어)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에는 세이부 그룹이 라이온스를 인수하여 구단 경영에 혁명을 일으켰다. 메이저 리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세이부 라이온스 구장 건설, 팬 서비스 강화, 적극적인 선수 보강 등을 통해 1980년대에 5차례의 일본 시리즈 우승(1982년 ~ 1983년, 1986년 ~ 1988년)을 달성하며 '야구계의 신 맹주'로 불렸다.
1994년에 이치로가 혜성같이 등장하여 1시즌 200개가 넘는 안타를 치는 대활약으로 팬들의 인기를 얻었다. 1990년대에는 후쿠오카 돔, 오사카 돔, 세이부 돔 등 퍼시픽 리그 홈구장들이 잇따라 돔 구장으로 바뀌면서, 닛폰햄을 포함하면 6개 구단 중 4개 구단이 돔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승 효과로 퍼시픽 리그의 관객 동원 수가 늘어나면서 센트럴 리그의 70%대까지 상승하게 되었다.[1]
1999년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가 일본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이듬해인 2000년에도 리그 연패를 달성하면서 '지역 밀착 구단'의 성공 사례로 야구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4년 6월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와 오릭스 블루웨이브의 합병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지역 밀착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리그 존속 위기를 맞았으나, 라쿠텐과 센다이 라이브도어 피닉스(라이브도어)가 리그 신규 참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2일 구단주 회의 결과 라쿠텐의 참가가 결정되었다(2004년 일본 프로 야구 재편 문제 참고). 이로써 2005년 시즌 이후에도 6개 구단 체제가 유지되었다. 센트럴 리그 주요 구단들이 경영 주체의 변화 없이 유지된 것과 달리, 퍼시픽 리그는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의 소멸로 인해 창설 이후 구단 운영 회사가 바뀌지 않은 구단은 신생 구단인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가 유일하다.[1] 2005년부터는 센트럴 리그와의 교류전이 시작되었다.[1]
2010년대에는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5번의 리그 우승과 6번의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를 지배했다.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스도 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다르빗슈 유, 이와쿠마 히사시, 다나카 마사히로, 오타니 쇼헤이 등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다.[53]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중 동원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4] 그러나 2022년 사사키 로키 (지바 롯데 마린스)의 활약과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우승으로 야구 인기가 다시 높아졌다.[4] 오릭스 버펄로스는 강력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4]
- '''굵은 글씨'''는 그해 일본 시리즈 우승팀
- 1973년 ~ 1982년은 전·후기 리그의 우승 팀의 최종 리그 결과.
- 2004년 ~ 2006년은 플레이오프 우승 팀의 1위.
2. 1. 퍼시픽 리그의 출범 (1949)
1949년 일본 야구 연맹 분열 당시, 리그 가맹에 찬성했던 난카이 호크스(현재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도큐 플라이어스(현재의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다이에이 스타스(후의 다이에이 유니온스), 한큐 브레이브스(현재의 오릭스 버펄로스)와 신생 구단인 마이니치 오리온스(현재의 지바 롯데 마린스), 긴테쓰 펄스(후의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 니시테쓰 클리퍼스(현재의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스)가 합류하여 총 7개 구단으로 '''태평양 야구 연맹'''이 발족되었다.[1] 1949년 11월 26일 각 구단 대표자 회의에서 신구단 가입 여부를 두고 일본야구연맹이 분열되면서, 같은 날 오후 1시 가입 찬성파 구단들과 신규 구단들이 모여 '''태평양 야구 연맹'''(太平洋野球連盟) 결단식을 거행했다. 이는 1949년 시즌 폐막 3일 전이었다.[5] 초대 회장은 다이에이 스타즈 구단주 나가타 마사이치였다.[1]2. 2. 1950년대: 여명기
이 시대는 난카이 호크스와 니시테쓰 라이온스의 황금 시대로, 양 팀의 대결은 '황금 카드'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1959년에는 센트럴 리그와의 관객 동원수를 놓고 경쟁했던 적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홀수 구단으로 인한 경기 일정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1954년 시즌 개막 전에 다카하시 유니온스가 연맹에 가입하여 8개 구단이 되었다. 다카하시 유니온스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시즌에 참가한 후에 1957년 2월 다이에이 스타즈와 합병되어(다이에이 유니온스로 변경) 7개 구단이 되었다. 1957년 시즌 종료 후 다이에이 유니온스가 마이니치 오리온스와 통합되면서 마이니치 다이에이 오리온스(통칭 다이마이 오리온스)가 되어 6개 구단으로 감소하였다.[52]2. 3. 1960년대: 쇠퇴기
1960년대는 텔레비전 보급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중심으로 센트럴 리그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대중 매체를 모체로 갖고 있지 않은 퍼시픽 리그는 역풍을 맞았다.[1] 마이니치 신문은 1960년 11월에 다이마이 오리온스 경영에서 손을 뗐다. 그런 가운데 다이마이 오리온스의 구단주가 된 나가타 마사이치는 사재를 털어 1962년 도쿄 미나미센주에 ‘도쿄 스타디움’을 완성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시픽 리그의 활성화에는 갈 길이 멀어보였다.2. 4. 1970년대: 암흑 시대
1969년 시즌 종료 후 발생한 검은 안개 사건은 니시테쓰 라이온스에 큰 타격을 주었고, 퍼시픽 리그 전체 이미지도 추락했다.[1] 영화 산업이 쇠퇴하면서 구단을 지원하던 기업들의 경영 능력이 약화되었고, 다이에이(나가타 마사이치 → 나카무라 나가요시) → 롯데, 도에이 → 닛타쿠홈 → 닛폰햄으로 구단 매각이 잇따랐다. (1973년 일본 프로 야구 재편 문제 참조)1975년 퍼시픽 리그 관객 동원 수는 센트럴 리그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시즌제(1973년 ~ 1982년), 지명타자 제도(1975년 ~ 현재)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1970년대는 한큐 브레이브스의 황금 시대였다. 한큐는 이 기간 동안 리그 우승을 9번 차지했다.
2. 5. 1980년대: 세이부 라이온스 황금 시대
1978년, 니시테쓰로부터 인수를 받았지만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나카무라 나가요시에게서 라이온스를 인수한 세이부 그룹은 구단 경영에 혁명을 일으켰다. 메이저 리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세이부 라이온스 구장 건설, 팬 서비스 강화, 적극적인 선수 보강 등을 통해 1980년대에 5차례의 일본 시리즈 우승(1982년 ~ 1983년, 1986년 ~ 1988년)을 달성하며 '야구계의 신 맹주'로 불렸다. NHK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사도 요미우리 경기 위주에서 벗어나 세이부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했다. 기요하라 가즈히로, 아와노 히데유키, 니시자키 유키히로 등 스타 선수들의 등장도 퍼시픽 리그 인기를 높였다.한편, 같은 철도사업자인 난카이와 한큐는 "프로 야구단을 보유하는 사명은 끝났다"라며 다이에와 오릭스에 구단을 매각했다. 1980년, 리그 명칭은 '''퍼시픽 야구 연맹'''(パシフィック野球連盟일본어)으로 변경되었다.
2. 6. 1990년대: 이치로 & 돔 구장 시대
1994년에 이치로가 혜성같이 등장하여 1시즌 200개가 넘는 안타를 치는 대활약으로 팬들의 인기를 얻었다. 이치로가 소속된 오릭스는 1995년에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이후 부흥의 상징으로서 팬들의 후원을 받아 1995년과 1996년에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노모 히데오, 마쓰자카 다이스케 등 간판급 선수들이 데뷔한 것도 이 시기였다. 1990년대에는 후쿠오카 돔, 오사카 돔, 세이부 돔 등 퍼시픽 리그 홈구장들이 잇따라 돔 구장으로 바뀌면서, 닛폰햄을 포함하면 6개 구단 중 4개 구단이 돔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승 효과로 퍼시픽 리그의 관객 동원 수가 늘어나면서 센트럴 리그의 70%대까지 상승하게 되었다.[1]2. 7. 2000년대: 지역 밀착 & IT 시대
1999년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가 일본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이듬해인 2000년에도 리그 연패를 달성하면서 '지역 밀착 구단'의 성공 사례로 야구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닛폰햄이 지역 밀착형 구단을 목표로 홋카이도로 이전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이전과 함께 구단명도 '홋카이도'가 붙여졌다). 다만 당시에는 지역 밀착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 않았고, 롯데도 1992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지바현으로 이전한 후 구단명에 '지바'를 붙였지만 오랜 침체로 관객 동원이 부진했다.[1]2004년 6월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와 오릭스 블루웨이브의 합병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지역 밀착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리그 존속 위기를 맞았으나, 라쿠텐과 센다이 라이브도어 피닉스(라이브도어)가 리그 신규 참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2일 구단주 회의 결과 라쿠텐의 참가가 결정되었다(2004년 일본 프로 야구 재편 문제 참고). 이로써 2005년 시즌 이후에도 6개 구단 체제가 유지되었다. 센트럴 리그 주요 구단들이 경영 주체의 변화 없이 유지된 것과 달리, 퍼시픽 리그는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의 소멸로 인해 창설 이후 구단 운영 회사가 바뀌지 않은 구단은 신생 구단인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가 유일하다.[1]
이러한 상황을 반성 삼아 퍼시픽 리그 각 구단은 여러 지역 밀착 방침을 내세웠다. 지바 롯데 마린스는 지바 마린 스타디움의 '볼파크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독특한 구단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2005년에는 31년 만에 일본 시리즈 우승, 2010년에도 일본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도쿄 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시절 관객 동원에 어려움을 겪던 닛폰햄은 2004년 프로 야구 구단이 없었던 홋카이도로 연고지를 이전했다. 홋카이도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층이 두터워 새로운 팬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지 언론과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구단, 감독, 선수들의 노력으로 기존 야구 팬과 야구에 관심 없던 여성층,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며 팬 정착에 성공했다.[1]
닛폰햄은 연고지 이전 후 3년 만에 리그 우승과 일본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리그 연패를 달성했다. 다이에, 지바 롯데에 이어 닛폰햄이 프로 야구 구단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전하여 성공을 거두면서, 프랜차이즈 구단이 지역과 구단에 가져오는 효과 등 지역 밀착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2005년 라쿠텐 참가와 함께 경영진이 쇄신된 세이부는 2008년부터 구단명을 '사이타마'로 변경하고 사이타마현 내 주최 경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 밀착 자세를 보이며 새로운 지역 밀착형 리그로 자리 잡았다. 2005년부터는 센트럴 리그와의 교류전이 시작되었다.[1]
2. 8. 2010년대
2010년대에는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5번의 리그 우승과 6번의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를 지배했다.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스도 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다르빗슈 유, 이와쿠마 히사시, 다나카 마사히로, 오타니 쇼헤이 등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다.[53]2017년 시즌에는 평균 관중 수 상위 3개 팀이 삿센히로후쿠(지방 중추 도시)에 위치한 지방 구단(★)이었고, 하위 3개 팀이 3대 도시권에 속한 팀이었다.
2. 9. 2020년대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중 동원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4] 그러나 2022년 사사키 로키 (지바 롯데 마린스)의 활약과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우승으로 야구 인기가 다시 높아졌다.[4]오릭스 버펄로스는 강력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4]
3. 소속 구단
1950년에 창설된 퍼시픽 리그에는 현재 6개의 구단이 소속되어 있다.
- 도큐·마이니치·다이에이: 도쿄도 고라쿠엔 구장(현재의 돔 호텔)
- 긴테쓰: 오사카부 후지이데라 구장
- 한큐: 효고현 한큐 니시노미야 구장
- 난카이: 오사카부 오사카 구장
- 니시테쓰: 후쿠오카현 헤이와다이 야구장
3. 1. 목록
(Hokkaido Nippon-Ham Fighters)(기타히로시마시)

(Tohoku Rakuten Golden Eagles)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Saitama Seibu Lions)
(도코로자와시)

(Chiba Lotte Marines)
(지바시 미하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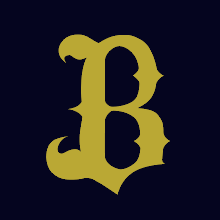
(Orix Buffaloes)
(오사카시 니시구)

(Fukuoka SoftBank Hawks)
(후쿠오카시 주오구)








